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만 있고 재판관도 청사도 직원도 예산도 없는, 실체 없는 조직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헌법위원회를 아는 법조인들은 별다른 기대를 품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없었다.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2023년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저자는 출범 후 20년 동안(책은 2007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취임사로 끝난다) 헌법재판소가 주요 사건마다 어떤 판결을 내리며 어떻게 위상을 구축해갔는지 추적한다.
‘1기 헌법재판소’의 과제는 대법원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탓에 두 기관이 곳곳에서 부딪치던 터다. “대법원의 최종 심판자 이미지를 탈색시키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의 미래는 없었다.”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영역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돌파했다. 1990년 ‘대법원 규칙’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대법원과의 고리를 끊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의 로비’ ‘결정문 사전 배포’ 등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책은 막전 막후를 상세하게 다룬다. 책 후반부에서 다루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대목이 흥미롭다. 탄핵 선고가 예정보다 3분 늦게 시작되고, 결정문에서 ‘소수의견’이 생략된 점에 주목해 취재에 돌입했다. 탄핵 기각까지 재판관·청와대·소추위원들 사이의 충돌을 고스란히 담았다.
책은 기자 출신인 저자의 성실한 취재와 방대한 자료 검토에 바탕을 둔다. 저자는 신문·잡지·논문·회의록 등 자료 1만 장 분량을 살피고, 재판관·연구관·청와대 관련자 등을 100시간가량 인터뷰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만 만나기 쉽다.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 논리가 어떻게 부딪치고 결론지어지는지, 헌법재판소 안팎의 역동이 궁금한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이상민 탄핵 기각에 이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기후재난 위기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참사 대응 실패도 반복되고 있다. 그사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이상민 탄핵 기각에 이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기후재난 위기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참사 대응 실패도 반복되고 있다. 그사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이태원 참사 누가 책임지나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7월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선고 직후...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이태원 참사 누가 책임지나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7월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선고 직후...
-
 “그때 이상민 장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국무위원이 탄핵 심판을 받는 건 헌정 사상 최초다. 헌법은 공직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할 수 있다고...
“그때 이상민 장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국무위원이 탄핵 심판을 받는 건 헌정 사상 최초다. 헌법은 공직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할 수 있다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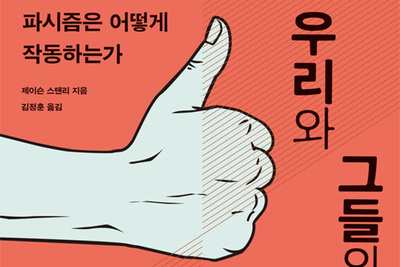 역사 비틀기와 ‘가짜’ 딱지, 파시즘의 얼굴 [기자의 추천 책]
찰스 린드버그는 대서양 횡단비행에 성공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인종주의에 경도된 친(親)나치 인사라는 사실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39년 기고에서 린드버그는 이렇게 썼...
역사 비틀기와 ‘가짜’ 딱지, 파시즘의 얼굴 [기자의 추천 책]
찰스 린드버그는 대서양 횡단비행에 성공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인종주의에 경도된 친(親)나치 인사라는 사실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39년 기고에서 린드버그는 이렇게 썼...
-
 어른 없는 사회에서 좋은 어른 되기 [기자가 추천하는 책]
작가는 오랜 취재원이다. 김보민 헝겊원숭이운동본부 이사장은 18년간 경기 부천, 군포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돌봄·복지 활동을 펼쳐왔다. 사각지대에 웅크린 아이들 이야기가 궁금하면 늘...
어른 없는 사회에서 좋은 어른 되기 [기자가 추천하는 책]
작가는 오랜 취재원이다. 김보민 헝겊원숭이운동본부 이사장은 18년간 경기 부천, 군포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돌봄·복지 활동을 펼쳐왔다. 사각지대에 웅크린 아이들 이야기가 궁금하면 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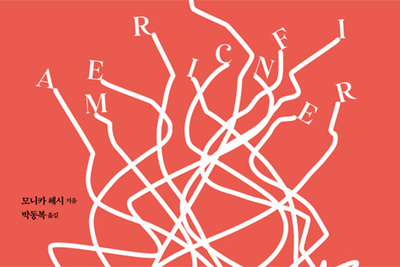 5개월 동안 86번 불을 질렀다 [기자의 추천 책]
혹시 ‘방화’라는 단어로 뉴스를 검색해본 적 있는가? (다짜고짜 물으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주간지 기자로 일하면 일주일 내내 수상쩍고 기상천외한 검색어를 입력할 수밖에 없다.) ...
5개월 동안 86번 불을 질렀다 [기자의 추천 책]
혹시 ‘방화’라는 단어로 뉴스를 검색해본 적 있는가? (다짜고짜 물으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주간지 기자로 일하면 일주일 내내 수상쩍고 기상천외한 검색어를 입력할 수밖에 없다.) ...
-
 저널리즘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기자의 추천 책]
기사를 찾아 읽다 날짜를 확인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최근 언론계 이슈를 다루면서다. 10~20년 전 기사인데 어제 쓴 것 같다. 언론 보도에 ‘좌편향’ 딱지를 붙이는 공세도, 공...
저널리즘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기자의 추천 책]
기사를 찾아 읽다 날짜를 확인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최근 언론계 이슈를 다루면서다. 10~20년 전 기사인데 어제 쓴 것 같다. 언론 보도에 ‘좌편향’ 딱지를 붙이는 공세도, 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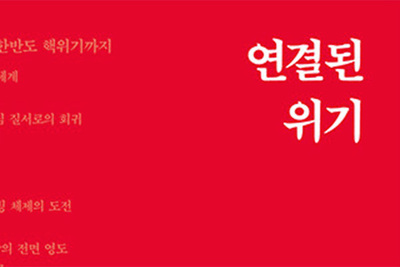 ‘전쟁 억제 기제’가 무너진 세상 [기자의 추천 책]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인플레이션을 잊고 살았다.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이 물가의 본성처럼 여겨졌다. 연간 15~20%의 인플레이션은 1950...
‘전쟁 억제 기제’가 무너진 세상 [기자의 추천 책]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인플레이션을 잊고 살았다.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이 물가의 본성처럼 여겨졌다. 연간 15~20%의 인플레이션은 19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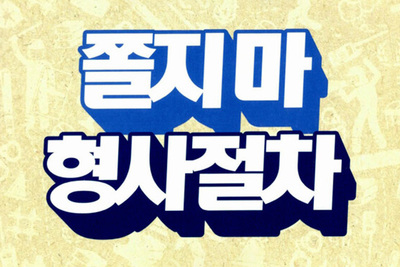 ‘압수수색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독서 [기자의 추천 책]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압수수색 소식이 들리는 요즘이다. 예전에도 이렇게 압수수색이 잦았나 싶다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까지 뻗어나가면 괜스레 마음이 어수선해진다...
‘압수수색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독서 [기자의 추천 책]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압수수색 소식이 들리는 요즘이다. 예전에도 이렇게 압수수색이 잦았나 싶다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까지 뻗어나가면 괜스레 마음이 어수선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