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찰스 린드버그는 대서양 횡단비행에 성공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인종주의에 경도된 친(親)나치 인사라는 사실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39년 기고에서 린드버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끼리의 다툼에서 벗어나 백인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다. 몽골인, 페르시아인, 무어인으로부터 우리 유산을 스스로 지킬 차례다.”
저자는 유대계 난민 가정에서 자란, 예일 대학 철학과 교수다. 그는 파시즘이 특정 역사적 시기, 특정 공간에만 퍼진 이념이 아니라고 적었다. 그에 따르면, 파시즘은 정부 성향에만 머무르지도 않는다. 사회 풍조에 가깝다. 린드버그의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은 같은 시기 “미국 친파시즘 정서의 대중적 얼굴”이라고 썼다. 친트럼프 시위,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에 대한 반발, 터키의 반세속주의적 여론 등이 오늘날 파시즘의 얼굴이라고 저자는 논증한다.
파시즘의 대전제는 ‘우리’와 ‘그들’의 존재다. 대화를 통한 갈등 조정은 불가하다. 파시즘 세계관은 “그들은 없이 우리만 있던, 낭만화된 허구적 과거”라는 신화에 기댄다. 이 작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사다. 그래서 “파시스트 정치는 민족의 암울했던 과거의 순간들을 모두 부인한다”. 폴란드와 터키는 자국의 전쟁범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일을 범죄로 만들었다. 대중에게 이를 설득하기 위해 파시즘은 반지성적 프로파간다를 동원한다.
한국 독자에게도 이 책은 먼 나라 철학자의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다. 지난 십수 년간 한국의 뉴라이트는 ‘자학적 사관’을 성토하고, 건국과 번영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가짜’ 딱지를 붙인다. 약자에 대한 혐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활개를 치고 있다. 여전히 이 사례들이 파시즘의 징후라고 여기는 것은 과잉 반응일까? 저자는 ‘정상 여부’에 대한 우리 판단을 의심하자고 제안한다. “한때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려는 집단적 경향”이야말로 파시즘 확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
 홍범도 장군, 그때는 독립군 지금은 빨치산?
2년 전 은퇴한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며칠, 다시 ‘강단’에 서고 있다. 밤낮없이 울리는 휴대전화로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앵커의 질문에...
홍범도 장군, 그때는 독립군 지금은 빨치산?
2년 전 은퇴한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며칠, 다시 ‘강단’에 서고 있다. 밤낮없이 울리는 휴대전화로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앵커의 질문에...
-
 “우크라이나 침공한 푸틴에게서 나치가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의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각에선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미국 일극 체제)’가 러시아·중국 등 여러 나라가 ‘지구 운영’에 참여하는 ‘다극...
“우크라이나 침공한 푸틴에게서 나치가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의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각에선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미국 일극 체제)’가 러시아·중국 등 여러 나라가 ‘지구 운영’에 참여하는 ‘다극...
-
 자유민주주의 앞세운 십자군 대통령의 성전
집권 2년 차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에 심취한 듯 보인다. 8월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앞세운 십자군 대통령의 성전
집권 2년 차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에 심취한 듯 보인다. 8월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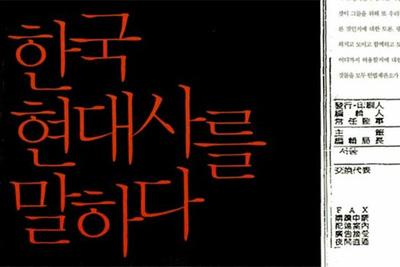 헌법재판소가 궁금하다면 [기자의 추천 책]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만 있고 재판관도 청사도 직원도 예산도 없는, 실체 없는 조직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헌법위원회를 아는 법조인들은 ...
헌법재판소가 궁금하다면 [기자의 추천 책]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만 있고 재판관도 청사도 직원도 예산도 없는, 실체 없는 조직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헌법위원회를 아는 법조인들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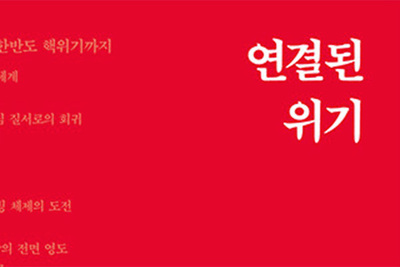 ‘전쟁 억제 기제’가 무너진 세상 [기자의 추천 책]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인플레이션을 잊고 살았다.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이 물가의 본성처럼 여겨졌다. 연간 15~20%의 인플레이션은 1950...
‘전쟁 억제 기제’가 무너진 세상 [기자의 추천 책]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인플레이션을 잊고 살았다.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이 물가의 본성처럼 여겨졌다. 연간 15~20%의 인플레이션은 1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