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방화’라는 단어로 뉴스를 검색해본 적 있는가? (다짜고짜 물으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주간지 기자로 일하면 일주일 내내 수상쩍고 기상천외한 검색어를 입력할 수밖에 없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강력범죄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사건은 많이 접하지만 왠지 방화는 좀 낯설게 들린다. 다행히 사상자가 없을 경우 크게 주목받지 않을뿐더러,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의 특성상 그 원인을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날마다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방화가 일어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2012년 11월12일 밤 10시41분, 미국 버지니아주 어코맥 카운티에서 “데니스 드라이브에 있는 빈집에 누군가 불을 질렀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날 밤에만 화재 신고가 두 건 더 들어왔다. 그리고 그 후 5개월 동안 총 86번이나. 2013년 4월1일 방화 용의자들이 붙잡힌 이후 〈워싱턴포스트〉 기자이자 작가인 모니카 헤시는 어코맥 카운티에서 몇 달씩 머물며 사건을 재구성한다. 한 페이지짜리 짤막한 머리말에 그는 이렇게 적는다. “정답이 있을 만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단서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희망, 가난, 자존심, 월마트, 발기불능, 스테이쿰(소고기를 얇게 저민 냉동식품), 모의, 그리고 미국. 종종 우리를 낙담케 하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미국.”
마치 그날, 그 시간에 방화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다. 공범 중 한 명과 수십 시간을 인터뷰한 데다 100명이 넘는 마을 사람과 공무원, 소방대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다. ‘왜 불을 질렀을까?’라는 단순한 질문은 이제 이렇게 바뀐다. 방화가 자주 일어나는 곳은 어떤 사회일까?
-
 글쓰기의 고단함 단 한 가지 처방은? [기자의 추천 책]
여기 〈뉴요커〉에서 ‘대단한 청탁’을 받은 한 작가가 있다. 작가는 글을 쓰기 전부터 자신의 이야기가 실릴 지면을 떠올리며 벅찬 감동을 느낀다. “〈뉴요커〉 폰트로 보면 어떤 모습...
글쓰기의 고단함 단 한 가지 처방은? [기자의 추천 책]
여기 〈뉴요커〉에서 ‘대단한 청탁’을 받은 한 작가가 있다. 작가는 글을 쓰기 전부터 자신의 이야기가 실릴 지면을 떠올리며 벅찬 감동을 느낀다. “〈뉴요커〉 폰트로 보면 어떤 모습...
-
 [기자의 추천 책] 목숨과 이름을 모두 빼앗긴 다섯 명의 여자
책 제목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잭 더 리퍼에게 희생된 다섯 여자 이야기.’ 영국의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의 이름은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
[기자의 추천 책] 목숨과 이름을 모두 빼앗긴 다섯 명의 여자
책 제목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잭 더 리퍼에게 희생된 다섯 여자 이야기.’ 영국의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의 이름은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
-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의 '현실과 희망 사이'
여기 동그란 케이크가 있다. 세 명이 이 케이크를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잘라야 할까? 대부분 자동차 회사 벤츠의 삼각형 로고를 떠올릴 것이다. 쉬운 문제다. 하지만 인지능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의 '현실과 희망 사이'
여기 동그란 케이크가 있다. 세 명이 이 케이크를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잘라야 할까? 대부분 자동차 회사 벤츠의 삼각형 로고를 떠올릴 것이다. 쉬운 문제다. 하지만 인지능력...
-
 우리가 모르는 독립운동가들을 위하여 [역사를 읽는 시간 ①]
역사책의 명가 푸른역사에서 나온 〈독립운동 열전〉은 두 권으로 되어 있다. 1권은 ‘잊힌 사건을 찾아서’, 2권은 ‘잊힌 인물을 찾아서’이다. 어떤 책을 먼저 읽어도 상관없는 독립...
우리가 모르는 독립운동가들을 위하여 [역사를 읽는 시간 ①]
역사책의 명가 푸른역사에서 나온 〈독립운동 열전〉은 두 권으로 되어 있다. 1권은 ‘잊힌 사건을 찾아서’, 2권은 ‘잊힌 인물을 찾아서’이다. 어떤 책을 먼저 읽어도 상관없는 독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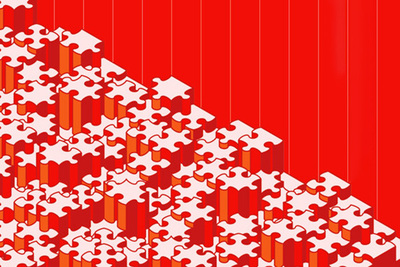 중국이라는 플랫폼을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 [기자의 추천 책]
한글날이 얼마 전이었으니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한글을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은 뭘까. ‘어린 백성’을 생각하는 왕의 ‘애민정신’이 가장 큰 동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요인이 ...
중국이라는 플랫폼을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 [기자의 추천 책]
한글날이 얼마 전이었으니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한글을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은 뭘까. ‘어린 백성’을 생각하는 왕의 ‘애민정신’이 가장 큰 동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요인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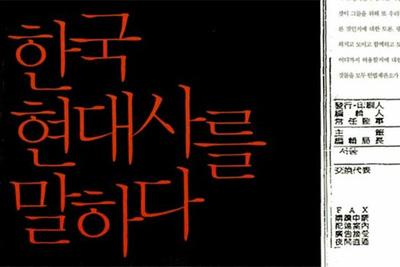 헌법재판소가 궁금하다면 [기자의 추천 책]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만 있고 재판관도 청사도 직원도 예산도 없는, 실체 없는 조직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헌법위원회를 아는 법조인들은 ...
헌법재판소가 궁금하다면 [기자의 추천 책]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만 있고 재판관도 청사도 직원도 예산도 없는, 실체 없는 조직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헌법위원회를 아는 법조인들은 ...
-
 사이코패스 뇌를 가진 신경과학자의 이야기 [기자의 추천 책]
2005년 어느 가을날, ‘젊은 사이코패스의 뇌를 이해하기 위한 신경해부학적 배경’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다듬던 한 신경과학자의 손이 멈칫한다. 정상 대조군으로 찍은 가족들의 뇌 스...
사이코패스 뇌를 가진 신경과학자의 이야기 [기자의 추천 책]
2005년 어느 가을날, ‘젊은 사이코패스의 뇌를 이해하기 위한 신경해부학적 배경’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다듬던 한 신경과학자의 손이 멈칫한다. 정상 대조군으로 찍은 가족들의 뇌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