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사를 썼다. 법의 취지대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려면,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다소 논쟁적인 내용이었다. 예컨대 정규직 노동자 임금과 성과급의 ‘최대치’가 아닌 ‘적정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일부라도 하청 노조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에 대해 취재 과정에서 마주쳤던 반론은 이랬다. ‘원·하청 구조를 만든 기업이 책임져야지, 왜 노동자끼리 나눠야 하나?’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2025년 내에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5세이니, 공백을 줄여가야 하는 것은 맞다. 문제는 임금이다.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이 늘어날 경우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줘야 할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정년만 늘어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숙련보다 많은 임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까지는 받아들일 모양새이지만, 숙련을 반영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드는 데는 소극적이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 자원이 무한하다고 여기는 듯한 태도에는 회의적이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소진 뒤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부담이 커지리라는 우려에 대해 ‘국고를 투입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세금 역시 미래세대 부담이 아니냐고 물으면 부자에게 걷으면 된다는 답이 돌아온다. 현실은 집값이 크게 올랐거나 금융투자로 큰 소득을 번 사람에게 제대로 된 과세조차 못한다. 설령 부자에게 더 걷는다고 해도, 그중 일부는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에서 국채를 무한정 발행하기도 어렵다.
내가 생각하는 연대는, 나와 내 공동체가 오래 지속 가능하도록 얼마간 고통을 감수하는 선택이다. 자원이 무한하다고 가정된 세계에서는 장기 이익을 위해 단기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 모두가 자신의 최대치를 추구하면 되니까. 그 가정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날 때, 과연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새 사회계약을 맺지 못하고 중요한 질문을 얼버무리는 동안, 소수자에게 적대적인 정치세력이 불신의 틈을 파고든다.
-
 노란봉투법, 원청 노동자의 연대 있어야 작동한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내년 3월10일 시행된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당초 노란봉투법안과 달리, ...
노란봉투법, 원청 노동자의 연대 있어야 작동한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내년 3월10일 시행된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당초 노란봉투법안과 달리, ...
-
 2030 이준석·김문수 투표자는 무엇이 달랐나 [6·3 대선 이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
이번 대선에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18~19세 포함) 남성의 37.2%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36.9%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뽑은 것으로 예측됐다. 20대 ...
2030 이준석·김문수 투표자는 무엇이 달랐나 [6·3 대선 이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
이번 대선에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18~19세 포함) 남성의 37.2%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36.9%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뽑은 것으로 예측됐다. 20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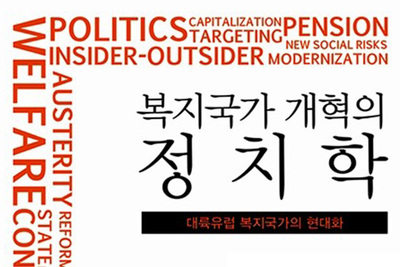 대륙 유럽의 연금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 [기자의 추천 책]
‘국민연금 폐지하라.’ 연금 개혁 기사에는 늘 날 선 댓글이 달린다. 보험료를 조금 거둬 많이 돌려주는 과거의 후한 연금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인구는 고...
대륙 유럽의 연금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 [기자의 추천 책]
‘국민연금 폐지하라.’ 연금 개혁 기사에는 늘 날 선 댓글이 달린다. 보험료를 조금 거둬 많이 돌려주는 과거의 후한 연금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인구는 고...
-
 연금 정치,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이다. 이대로라면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기금 고...
연금 정치,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이다. 이대로라면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기금 고...
-
 정년 연장은 왜 사회정의가 아닌가
현대차·기아차·한국GM 등 완성차 3사 노조 위원장들이 정년 65세 법제화를 요구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 이상인데, 이를 5년 더 늘려 65세 이상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왜 사회정의가 아닌가
현대차·기아차·한국GM 등 완성차 3사 노조 위원장들이 정년 65세 법제화를 요구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 이상인데, 이를 5년 더 늘려 65세 이상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기재부 관료가 답하다
기획재정부 관료를 흔히 ‘곳간지기’로 묘사한다. 누군가의 절박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며 재정건전성을 외치는 ‘뿔 달린 악마’쯤으로 상상하는 사람도 있다. 시민으로서 경제관료의 관점...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기재부 관료가 답하다
기획재정부 관료를 흔히 ‘곳간지기’로 묘사한다. 누군가의 절박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며 재정건전성을 외치는 ‘뿔 달린 악마’쯤으로 상상하는 사람도 있다. 시민으로서 경제관료의 관점...
-
 예산,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국채는 GDP 대비 몇 퍼센트까지 발행하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윤석열 국민의힘 후보)“IMF나 국제기구들은 85%까지 유지하는 게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이야...
예산,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국채는 GDP 대비 몇 퍼센트까지 발행하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윤석열 국민의힘 후보)“IMF나 국제기구들은 85%까지 유지하는 게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이야...
-
 1년 전 그날의 뒷이야기 ‘커밍 순’ [프리스타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사당은 1948년 제헌국회가 열린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청사)이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여러 장소로 옮겨다니던 국회는 1975년 지금의 자...
1년 전 그날의 뒷이야기 ‘커밍 순’ [프리스타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사당은 1948년 제헌국회가 열린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청사)이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여러 장소로 옮겨다니던 국회는 1975년 지금의 자...
-
 이삭줍기에 실패한 수많은 날들에 부쳐 [프리스타일]
“됐어요, 당장 나가세요.” 아직 바람이 차갑던 봄날이었다. 고독사를 취재하러 갔다가 들른 부동산이었다. 공인중개사에게 명함을 내밀자마자 문전박대를 당했다. 여기뿐일까. “아이고,...
이삭줍기에 실패한 수많은 날들에 부쳐 [프리스타일]
“됐어요, 당장 나가세요.” 아직 바람이 차갑던 봄날이었다. 고독사를 취재하러 갔다가 들른 부동산이었다. 공인중개사에게 명함을 내밀자마자 문전박대를 당했다. 여기뿐일까. “아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