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정치 기사를 쓰면서 법안을 들여다볼 기회가 종종 있었다.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정의당 당대표 성추행 사건, 민주당 언론개혁 법안을 한 주씩 다뤘는데 사안은 달랐지만 ‘강한 징벌’에 대한 요구가 공통적으로 있었다. 법대로 처리하고 법이 부족하면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라도 가해자를 징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찬성표를 얻었다. 그에 비해 처벌이 능사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 일은 고되고 복잡했다. 어떻게 아동학대 대응 현장을 망가뜨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를 지우는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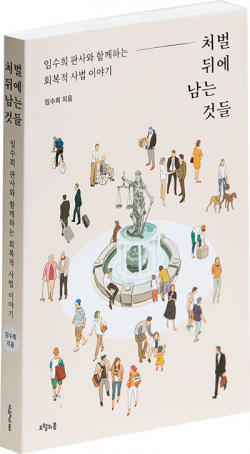
법으로 처벌만 하면 끝일까? 사법절차로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가? 취재를 하며 쌓였던 고민들이 이 책을 읽으며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 현직 판사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회복적 사법의 관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았다. “판결 이후 남은 피해자의 고통과 회복되지 않은 피해, 깨어진 관계와 파괴된 공동체. 재판과 판결의 뒤에 남겨진 이것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012년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그가 마주했던 질문이다. 임 판사는 피해 당사자가 형사재판에서 철저히 수동적 입장에만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정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도록 한다. 때로는 가해자 처벌이나 금전배상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42개국 중 39위로 낮은데(2015년 OECD), 민형사 소송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정에 서는 것은 연루된 모든 이들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에 비유되곤 한다. 한국 사법체계는 이런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능했다. 회복적 사법은 ‘처벌 강화’라는 쉬운 선택 대신 복잡하고 고된 대화의 과정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저자는 “법원이 작금의 사법 불신을 극복하는 하나의 좋은 통로가 ‘회복적 사법’ 제도화의 모색이 아닐까”라고 말한다. 읽는 내내 법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질문하게 된다.
-
 [기자들의시선]“사랑하는 제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이 주의 기업5월26일 프랑스와 미국의 에너지 기업 토탈(Total)과 셰브론(Chevron)이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공사(MOGE)와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나란...
[기자들의시선]“사랑하는 제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이 주의 기업5월26일 프랑스와 미국의 에너지 기업 토탈(Total)과 셰브론(Chevron)이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공사(MOGE)와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나란...
-
 ‘위안부’ 둘러싼 ‘비교’의 양면성
2019년 8월 한국 언론에 “베트남 일본군 ‘위안소’, 문서로 첫 확인”이라는 소식이 실렸다. 일본군이 베트남 침공 직후 ‘위안소’를 세웠다는 기록을 프랑스에서 발견했다는 기사였...
‘위안부’ 둘러싼 ‘비교’의 양면성
2019년 8월 한국 언론에 “베트남 일본군 ‘위안소’, 문서로 첫 확인”이라는 소식이 실렸다. 일본군이 베트남 침공 직후 ‘위안소’를 세웠다는 기록을 프랑스에서 발견했다는 기사였...
-
 문화화된 폭력의 지극히 평범한 얼굴
2020년은 광역단체장 두 명의 성추행 혐의가 공론화된 해다. ‘여권 인사의 불명예 퇴진’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은 무성했으나, 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되풀이되는지 응답하는...
문화화된 폭력의 지극히 평범한 얼굴
2020년은 광역단체장 두 명의 성추행 혐의가 공론화된 해다. ‘여권 인사의 불명예 퇴진’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은 무성했으나, 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되풀이되는지 응답하는...
-
 성범죄 피해자에게 회복이란 무엇일까
지난 3월 성착취 범죄집단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었다. 이로부터 8개월이 지난 11월26일, 조씨와 공범 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
성범죄 피해자에게 회복이란 무엇일까
지난 3월 성착취 범죄집단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었다. 이로부터 8개월이 지난 11월26일, 조씨와 공범 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
-
 박래군, 역사적 현장을 인권의 시각으로…
인권운동가 박래군(59). 그가 편집국에 등장하자 몇몇 기자들이 자연스레 인사를 나눴다. 한 기자는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를 논할 때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였던 그를 처음 취재했...
박래군, 역사적 현장을 인권의 시각으로…
인권운동가 박래군(59). 그가 편집국에 등장하자 몇몇 기자들이 자연스레 인사를 나눴다. 한 기자는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를 논할 때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였던 그를 처음 취재했...
-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생긴다면 [새로 나온 책]
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앨러스데어 코크런 지음, 박진영·오창룡 옮김, 창비 펴냄“우리의 정치 공동체는 다종 공동체이다.”‘동물과의 정치적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그것은 어떤 형태가 ...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생긴다면 [새로 나온 책]
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앨러스데어 코크런 지음, 박진영·오창룡 옮김, 창비 펴냄“우리의 정치 공동체는 다종 공동체이다.”‘동물과의 정치적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그것은 어떤 형태가 ...
-
 [기자의 추천 책] 일하는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당신에게
‘워라밸’은 최근 생긴 신조어다.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줄인 말이다.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말은 ‘일을 덜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통한다...
[기자의 추천 책] 일하는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당신에게
‘워라밸’은 최근 생긴 신조어다.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줄인 말이다.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말은 ‘일을 덜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통한다...
-
 “가난하고 못 배웠으면 애 낳지 말란 신호 같아”
문자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왔다. “말씀해주신 흐엉 씨 사건('아이와 부모 고통 주는 허술한 법 한 줄' 기사 참조), ㄱ시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건이라는 대...
“가난하고 못 배웠으면 애 낳지 말란 신호 같아”
문자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왔다. “말씀해주신 흐엉 씨 사건('아이와 부모 고통 주는 허술한 법 한 줄' 기사 참조), ㄱ시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건이라는 대...
-
 죄는 어른이 짓고 벌은 아이가 받고
그날은 어린이집 차량이 서지 않고 지나갔다. 5월13일 오후 5시, 집 앞에서 두 동생을 기다리던 민주(가명·8)는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둘째 민서(가명·6)와 셋째 민희(...
죄는 어른이 짓고 벌은 아이가 받고
그날은 어린이집 차량이 서지 않고 지나갔다. 5월13일 오후 5시, 집 앞에서 두 동생을 기다리던 민주(가명·8)는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둘째 민서(가명·6)와 셋째 민희(...
-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면 안 될까요?” [프리스타일]
긴 사연이었다. 자주 걸려오는 제보 전화 중 하나였지만 쉽게 끊을 수 없었다. 경기 김포에서 이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는 ‘그런데’나 ‘알고 보니’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면 안 될까요?” [프리스타일]
긴 사연이었다. 자주 걸려오는 제보 전화 중 하나였지만 쉽게 끊을 수 없었다. 경기 김포에서 이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는 ‘그런데’나 ‘알고 보니’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