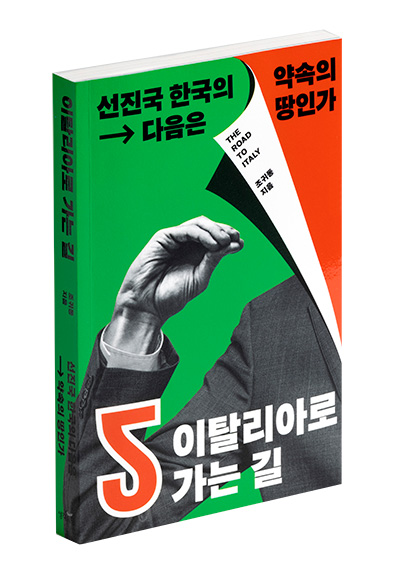
혼란스러운 여름이다. 수해 피해부터 초등교사의 죽음, 흉기 난동 그리고 잼버리 사태까지 모두 어딘가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구석을 담고 있지만 좀처럼 사회적 의제가 되지 못하고 손에 쥔 모래처럼 흩어진다. 그 위를 또 다른 사건·사고와 이슈가 뒤덮을 뿐이다. 한국 사회는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닐까. 무더위 속에서 의구심이 짙어진다.
저자는 한국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이탈리아는 흔히 떠올리는 매력적인 여행지가 아니다. 1980년대에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선진국에 걸맞은 사회경제적 제도 전환에 실패하고 포퓰리즘 정치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나라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2020년 기준 1.24명으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낮다. 제일 낮은 나라는 한국이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 역시 1980년대 이탈리아가 그랬듯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 전체적인 기능부전은 부패한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가 아니라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방식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 질서가 형성된 시기를 2000년대 초중반으로 꼽는다. 정치적으로는 상위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직접 참여 민주주의이고, 경제적으로는 수출 기반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로 분리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이다.
정치는 점점 더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전통적 기반인 호남에 더해 서울의 상위 중산층 집단이 주된 지지층으로 거듭났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강남 3구로 대변되는 자산가 계층에 중산층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이 연합하는 모양새이다. 두 정당 모두 지지 기반이 사회경제적으로 양분돼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는 포퓰리즘이 싹트기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한다. 포퓰리즘은 단순히 인기 영합주의가 아니라 '사회가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뉜다는 세계관’이라고 이 책은 지적한다.
사실 이탈리아 얘기는 서두에 언급될 뿐이다. 대부분의 분량은 한국이 봉착한 내재적 한계를 분석하는 데에 할애돼 있다. 부유하던 위기들을 한데 모아 좀 더 선명한 렌즈로 들여다볼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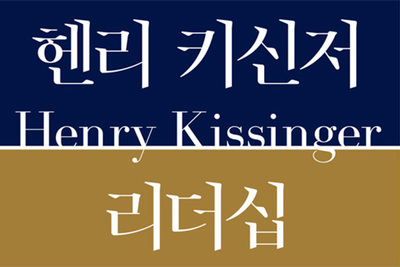 리더가 중요한 이유 [기자의 추천 책]
‘좋은 리더’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요즘이다. 보통 위기 시 당사자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 말에 토를 단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의견이 생겼다. 위기 시에는 실력이 ...
리더가 중요한 이유 [기자의 추천 책]
‘좋은 리더’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요즘이다. 보통 위기 시 당사자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 말에 토를 단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의견이 생겼다. 위기 시에는 실력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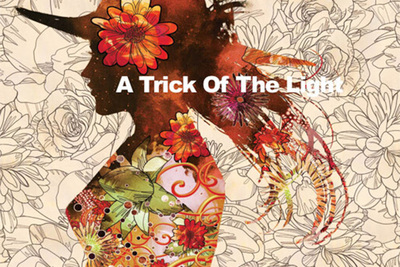 살인은 복잡하다, 거짓과 연민 때문에 [기자의 추천 책]
여름, 추리소설의 미덕은 스피드다. 뇌를 가동하는 데도 에너지가 든다. 에너지를 쓰면 열이 난다. 그러니 최대한 뇌를 절전 모드로 해두고 별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이야기...
살인은 복잡하다, 거짓과 연민 때문에 [기자의 추천 책]
여름, 추리소설의 미덕은 스피드다. 뇌를 가동하는 데도 에너지가 든다. 에너지를 쓰면 열이 난다. 그러니 최대한 뇌를 절전 모드로 해두고 별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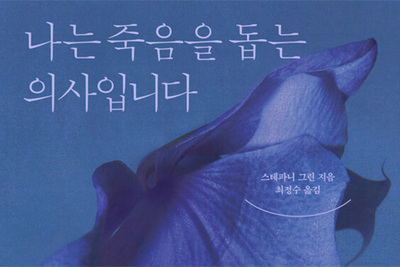 조력 사망은 어떻게 이뤄지나? [기자의 추천 책]
저자 스테파니 그린은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이다. 캐나다가 ‘의료 조력 사망(MAiD)’을 허용한 2016년, 업을 바꿔 캐나다 최초 조력 사망을 수행했다. ‘조력 사망’이라고 쓰는...
조력 사망은 어떻게 이뤄지나? [기자의 추천 책]
저자 스테파니 그린은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이다. 캐나다가 ‘의료 조력 사망(MAiD)’을 허용한 2016년, 업을 바꿔 캐나다 최초 조력 사망을 수행했다. ‘조력 사망’이라고 쓰는...
-
 저널리즘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기자의 추천 책]
기사를 찾아 읽다 날짜를 확인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최근 언론계 이슈를 다루면서다. 10~20년 전 기사인데 어제 쓴 것 같다. 언론 보도에 ‘좌편향’ 딱지를 붙이는 공세도, 공...
저널리즘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기자의 추천 책]
기사를 찾아 읽다 날짜를 확인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최근 언론계 이슈를 다루면서다. 10~20년 전 기사인데 어제 쓴 것 같다. 언론 보도에 ‘좌편향’ 딱지를 붙이는 공세도, 공...
-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자의 추천 책]
세 사람이 등장한다. 어릴 적 피아노 영재였지만 교통사고 후 삶의 의미를 잃은 한국계 이주민 여성 피비,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신학대생이었지만 믿음을 잃은 뒤 새로운 길을 찾는 윌,...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자의 추천 책]
세 사람이 등장한다. 어릴 적 피아노 영재였지만 교통사고 후 삶의 의미를 잃은 한국계 이주민 여성 피비,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신학대생이었지만 믿음을 잃은 뒤 새로운 길을 찾는 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