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스테파니 그린은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이다. 캐나다가 ‘의료 조력 사망(MAiD)’을 허용한 2016년, 업을 바꿔 캐나다 최초 조력 사망을 수행했다. ‘조력 사망’이라고 쓰는 이유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 죽음을 ‘안락사’라고 포장해온 역사 때문이다.
조력 사망은 한국에서도 첨예한 논쟁이지만 법과 철학에 대한 사변적 논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근래 들어서는 질병의 고통 탓에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조명된다. 책은 상상밖에 할 수 없던 구체적 질문들에 답한다. 조력 사망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죽기로 정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며, 의사는 어떤 일을 수행할까?
캐나다 법은 조력 사망 적합성을 엄격하게 따진다. 아무나 죽을 수 없다. 기본 원칙은 ‘건강한 사람은 부적합하다’는 것. 저자가 처음 만난 조력 사망 지원자는 94세 노인이었다. 그는 신체 기능이 쇠퇴했고 죽고 싶어 했으나, “위중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앓아야 한다”라는 조항을 충족하지 못해 조력 사망을 하지 못했다.
책은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우선 조력 사망 과정 전반을 상세히 설명한다. 어떤 약물이 쓰이는지, 의사가 환자와 가족에게 무엇을 알리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따위다. 일반인은 모르는 특이 분야 전문가의 경험적 수필로도 읽을 수 있다. 순탄치 않았던 유년기를 보낸 산부인과 의사가 흔치 않은 길을 택해 느낀 바를 기록했다. 생생한 환자들의 일화가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이다. 죽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 무슨 이야기를 할까?
책은 환자들의 주체성과 침착함, 용기를 부각한다. 분장을 하고 농담을 건네며 영면에 드는 환자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울음을 참는 가족들의 배려가 모두 인상적이다. 흥미로운 주제를 쉬운 문장에 담았지만 읽는 내내 마음이 무겁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택하거나,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서일까.
-
 집은 좋은 죽음을 보장하는 장소인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현장 연구를 할 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었다. “노인이 그간 살아온 익숙한 장소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임종할 수는 없을까요?” 단박에 대답하기 어려웠다. 이...
집은 좋은 죽음을 보장하는 장소인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현장 연구를 할 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었다. “노인이 그간 살아온 익숙한 장소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임종할 수는 없을까요?” 단박에 대답하기 어려웠다. 이...
-
 케이틀린 도티 “우리는 모두 시신이 될 사람들”
나이 듦, 질병, 돌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도 없다. ‘존엄한 죽음’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사IN〉은 의사·의료인류...
케이틀린 도티 “우리는 모두 시신이 될 사람들”
나이 듦, 질병, 돌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도 없다. ‘존엄한 죽음’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사IN〉은 의사·의료인류...
-
 [특집]‘죽음의 미래’- ‘아픈 몸’도 아픈 대로의 삶이 있음을
나이 듦, 질병, 돌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도 없다. ‘존엄한 죽음’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사IN〉은 의사·의료인류...
[특집]‘죽음의 미래’- ‘아픈 몸’도 아픈 대로의 삶이 있음을
나이 듦, 질병, 돌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도 없다. ‘존엄한 죽음’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사IN〉은 의사·의료인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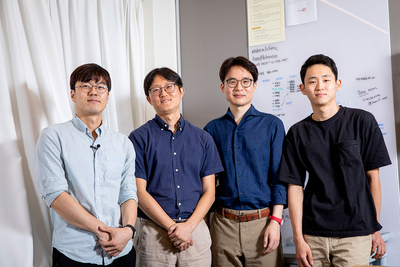 [특집] ‘죽음의 미래’ - ① 당신은 어디에서 죽고 싶습니까
얼굴이 없는 ‘사망자 숫자’10월7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사망자는 425명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을 가깝게 느끼지만 매일같이 집계되어 공표되는 숫자에는 ‘얼굴’이...
[특집] ‘죽음의 미래’ - ① 당신은 어디에서 죽고 싶습니까
얼굴이 없는 ‘사망자 숫자’10월7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사망자는 425명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을 가깝게 느끼지만 매일같이 집계되어 공표되는 숫자에는 ‘얼굴’이...
-
 존엄사 논쟁 일으켰던 어느 프랑스인의 죽음
7월11일 아침, 11년간 프랑스에서 존엄사 논란을 일으켰던 뱅상 랑베르가 세상을 떠났다. 프랑스 최고재판소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최종 판결에 따라 랭스 대...
존엄사 논쟁 일으켰던 어느 프랑스인의 죽음
7월11일 아침, 11년간 프랑스에서 존엄사 논란을 일으켰던 뱅상 랑베르가 세상을 떠났다. 프랑스 최고재판소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최종 판결에 따라 랭스 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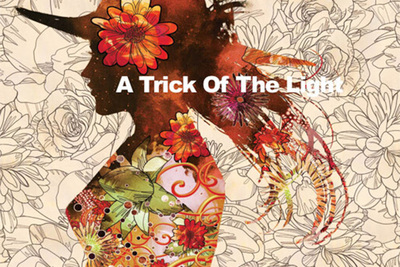 살인은 복잡하다, 거짓과 연민 때문에 [기자의 추천 책]
여름, 추리소설의 미덕은 스피드다. 뇌를 가동하는 데도 에너지가 든다. 에너지를 쓰면 열이 난다. 그러니 최대한 뇌를 절전 모드로 해두고 별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이야기...
살인은 복잡하다, 거짓과 연민 때문에 [기자의 추천 책]
여름, 추리소설의 미덕은 스피드다. 뇌를 가동하는 데도 에너지가 든다. 에너지를 쓰면 열이 난다. 그러니 최대한 뇌를 절전 모드로 해두고 별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이야기...
-
 리더가 중요한 이유 [기자의 추천 책]
‘좋은 리더’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요즘이다. 보통 위기 시 당사자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 말에 토를 단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의견이 생겼다. 위기 시에는 실력이 ...
리더가 중요한 이유 [기자의 추천 책]
‘좋은 리더’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요즘이다. 보통 위기 시 당사자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 말에 토를 단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의견이 생겼다. 위기 시에는 실력이 ...
-
 한국은 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을까 [기자의 추천 책]
혼란스러운 여름이다. 수해 피해부터 초등교사의 죽음, 흉기 난동 그리고 잼버리 사태까지 모두 어딘가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구석을 담고 있지만 좀처럼 사회적 의제가 되지 못하고 손에...
한국은 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을까 [기자의 추천 책]
혼란스러운 여름이다. 수해 피해부터 초등교사의 죽음, 흉기 난동 그리고 잼버리 사태까지 모두 어딘가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구석을 담고 있지만 좀처럼 사회적 의제가 되지 못하고 손에...
-
 저널리즘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기자의 추천 책]
기사를 찾아 읽다 날짜를 확인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최근 언론계 이슈를 다루면서다. 10~20년 전 기사인데 어제 쓴 것 같다. 언론 보도에 ‘좌편향’ 딱지를 붙이는 공세도, 공...
저널리즘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기자의 추천 책]
기사를 찾아 읽다 날짜를 확인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최근 언론계 이슈를 다루면서다. 10~20년 전 기사인데 어제 쓴 것 같다. 언론 보도에 ‘좌편향’ 딱지를 붙이는 공세도, 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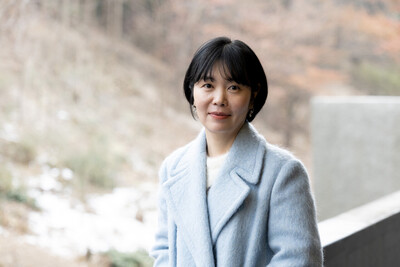 “신파는 안 돼”, 딸이 쓴 엄마의 ‘죽음 이행기’
흰색 니트를 입은 남유하 작가의 귀에 은으로 제작한 리본 모양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발린 검정 매니큐어도 눈에 들어왔다. 밝은 계열의 색이 잘 어울리는 ...
“신파는 안 돼”, 딸이 쓴 엄마의 ‘죽음 이행기’
흰색 니트를 입은 남유하 작가의 귀에 은으로 제작한 리본 모양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발린 검정 매니큐어도 눈에 들어왔다. 밝은 계열의 색이 잘 어울리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