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도 어느새 5분의 1을 지나고 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20세기에서 사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레트로 열풍이 거세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취향을 만들어준 20세기 문화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 시대의 ‘클래식’이 된 대중문화와 디자인, 라이프스타일은 사실 태어난 지 100년도 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친애하는 20세기〉는 출판·음식·건축·디자인·미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20세기의 문화 아이콘이 태어난 과정을 보여준다. 시작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다. 지구의 일기장으로도 불리는 이 잡지는 원래 학술 단체로 시작했다. 지구의 자연환경, 동물의 생태는 물론 고고학과 인류 문명까지 광범위한 지식을 다루면서, 생생한 사진으로 지구의 흔적을 기록하며 다큐멘터리 잡지의 아이콘이 되었다. 20세기에는 이외에도 〈라이프〉 〈도무스〉 〈비저네어〉 같은 혁신적이면서 깊이 있는 잡지가 새로운 지식과 관점, 미학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
탈것 역시 20세기 문화의 지도를 바꾼 요소 중 하나다. 자전거를 살펴보자. 최초의 자전거는 바퀴와 몸통은 있었지만, 페달도 없었고 방향을 틀 수도 없었다. 사람들은 자전거에 올라타 발로 땅을 차며 달렸다. 자전거에 페달이 장착된 것은 자전거가 세상에 나온 후 거의 70년이 지나서였다. 이후 철도와 자동차가 등장해 세상의 거리를 더욱 좁혔는데 특히 자동차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의 각축장이기도 했다.

기능과 맵시의 끊임없는 충돌
20세기 산업 디자인에는 독일 바우하우스가 큰 영향을 끼쳤다. 나치의 박해로 20년도 지속하지 못했지만, 기능과 비례를 중시했고 미니멀한 디자인 원칙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세계적 디자이너가 자동차 외에도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물이 있었으니, 바로 ‘의자’였다. 의자야말로 디자인과 공학, 자본의 접점에서 탄생한 20세기 산업 디자인의 아이콘이었다.
문화를 논하는 데 음식과 술이 빠질 수 없다. ‘벨에포크’라 불리는 20세기 초 파리의 감성이 살아 있는 대표적 디저트가 마카롱이다. 한국에 온 마카롱은 더 크고 화려해져 ‘뚱카롱’으로 변화했다. 스코틀랜드의 물과 흙, 그리고 바람이 만드는 위스키는 어떤가. 본래 양조장마다 각자 개성을 살린 싱글 몰트위스키를 만들었다. 그런데 대량으로 위스키를 만들 수 있게 되자 몰트위스키에 이것저것을 섞어 대중적인 블렌디드 스카치위스키가 탄생했다. 유행은 돌고 돈다고 이제는 다시 개성 있는 싱글 몰트위스키가 인기다.
20세기 문화의 걸작들은 극소수만 누리던 문화가 산업화를 통해 대중에 퍼져 나가면서 탄생했다. 그 과정에서 기능과 미학적 맵시는 끊임없이 충돌했고, 적절한 균형을 찾은 것만이 ‘클래식’이 되어 살아남았다. 자본주의·산업화·글로벌이 20세기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였듯, 20세기 문화도 그 기반 위에서 탄생했다. 과연 21세기 문화는 어떤 기반 위에서 흥망성쇠를 겪으며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질까?
-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생긴다면 [새로 나온 책]
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앨러스데어 코크런 지음, 박진영·오창룡 옮김, 창비 펴냄“우리의 정치 공동체는 다종 공동체이다.”‘동물과의 정치적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그것은 어떤 형태가 ...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생긴다면 [새로 나온 책]
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앨러스데어 코크런 지음, 박진영·오창룡 옮김, 창비 펴냄“우리의 정치 공동체는 다종 공동체이다.”‘동물과의 정치적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그것은 어떤 형태가 ...
-
 멍청해서 ‘새대가리’라고? 큰 착각입니다
예전에 판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판교는 첨단 IT 기업의 현대식 사옥이 줄지어 늘어선 곳이다. 회사 옆에 금토천이 흘러서 점심을 먹고 자주 걷곤 했는데, 종종 하얗고 날개가 큰...
멍청해서 ‘새대가리’라고? 큰 착각입니다
예전에 판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판교는 첨단 IT 기업의 현대식 사옥이 줄지어 늘어선 곳이다. 회사 옆에 금토천이 흘러서 점심을 먹고 자주 걷곤 했는데, 종종 하얗고 날개가 큰...
-
 한계에서 포착한 예술 포토저널리즘
때로는 사진 한 장이 백 마디 말보다 강력할 때가 있다. 탄성이 나오는 대자연의 풍경이나 소시민의 평범한 일상, 전쟁과 테러의 끔찍한 현장까지 한 장의 이미지에도 다양한 스펙트럼과...
한계에서 포착한 예술 포토저널리즘
때로는 사진 한 장이 백 마디 말보다 강력할 때가 있다. 탄성이 나오는 대자연의 풍경이나 소시민의 평범한 일상, 전쟁과 테러의 끔찍한 현장까지 한 장의 이미지에도 다양한 스펙트럼과...
-
 안 가본 지구인은 있어도 한 번으로 족한 우주인은 없다
우주가 다시 ‘핫’해졌다. 스페이스 엑스는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을 그대로 회수했다. 우주개발은 자고로 나사(NASA)처럼 초강대국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던 일인데, 이제는 민간...
안 가본 지구인은 있어도 한 번으로 족한 우주인은 없다
우주가 다시 ‘핫’해졌다. 스페이스 엑스는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을 그대로 회수했다. 우주개발은 자고로 나사(NASA)처럼 초강대국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던 일인데, 이제는 민간...
-
 [기자의 추천 책] 일하는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당신에게
‘워라밸’은 최근 생긴 신조어다.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줄인 말이다.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말은 ‘일을 덜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통한다...
[기자의 추천 책] 일하는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당신에게
‘워라밸’은 최근 생긴 신조어다.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줄인 말이다.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말은 ‘일을 덜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통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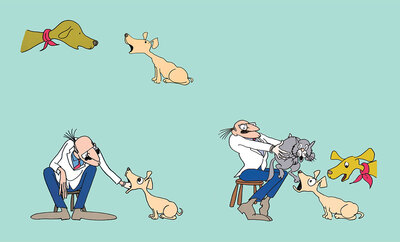 고양이,오리,돼지,소가 내 안에 들어있다면 - 〈짖어봐 조지야〉
엄마 개가 강아지에게 말한다. “짖어봐, 조지야.” 조지가 짖는다. “야옹.” 엄마가 개는 멍멍 짖는 법임을 가르치지만, 이어지는 소리는 점입가경이다. 꽥꽥, 꿀꿀, 음매… 점점 ...
고양이,오리,돼지,소가 내 안에 들어있다면 - 〈짖어봐 조지야〉
엄마 개가 강아지에게 말한다. “짖어봐, 조지야.” 조지가 짖는다. “야옹.” 엄마가 개는 멍멍 짖는 법임을 가르치지만, 이어지는 소리는 점입가경이다. 꽥꽥, 꿀꿀, 음매… 점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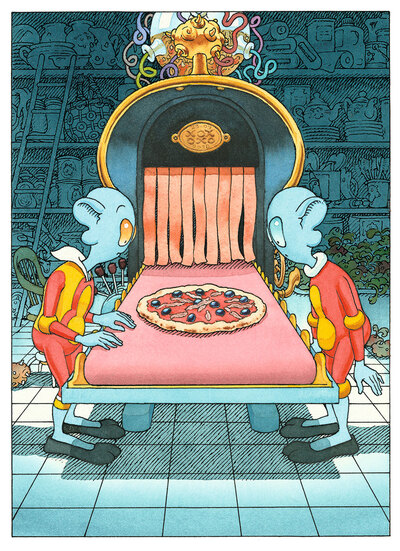 [그림의 영토]쓸모없으면 어때? 행복하면 그만이지 - 〈XOX와 OXO〉
아이의 예술성이 가장 반짝였을 때는 대여섯 살 무렵이었다. 집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도 없었고, 함께 놀이를 할 또래도 없었다. 아이는 마치 ‘상상의 집’을 짓고 있는 듯 상상 ...
[그림의 영토]쓸모없으면 어때? 행복하면 그만이지 - 〈XOX와 OXO〉
아이의 예술성이 가장 반짝였을 때는 대여섯 살 무렵이었다. 집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도 없었고, 함께 놀이를 할 또래도 없었다. 아이는 마치 ‘상상의 집’을 짓고 있는 듯 상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