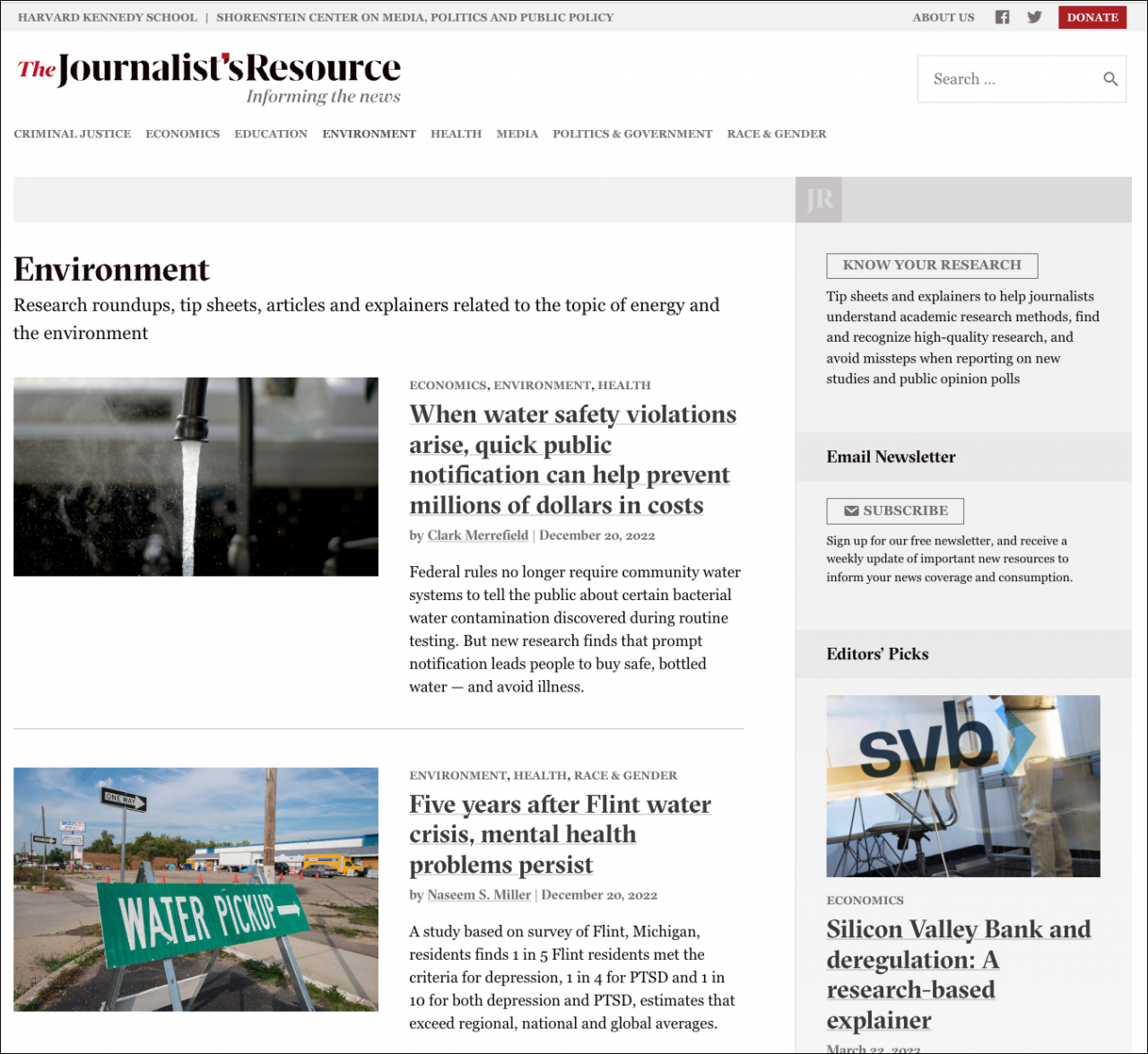
최근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인터뷰 발언을 날조해 보도한 〈중앙선데이〉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1월 〈중앙선데이〉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화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신 교수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는데, 당시 신 교수가 〈중앙선데이〉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는데도 취재 없이 발언을 지어내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비윤리적이다.
그런데 이 건을 둘러싼 생각은 전문가 취재의 어려움과 전문가 인용의 쓸모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기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상 업무 중 하나가 전문가 취재다. 매일 다종다양한 사건과 마주하는 기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누군지 파악하고, 연락처를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 때문에 현장 기자들은 소위 ‘꾸미(일본어로 ‘조’를 의미)’라 부르는 친목 그룹을 만들고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 분야 전문가 아시면 알려주세요” “○○ 연락처를 아시면 알려주세요”라는 식으로 전문가를 찾아 헤매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그 전문가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가짜 전문가라도 찾는다. 언론사에 근무했던 십수 년 전 동료들 사이에는 척척박사 교수님으로 불린 분이 있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라도 의견을 청하면 술술 이야기해주셨는데, 심지어 한 동료에게는 “그냥 원하는 대로 쓰세요”라며 전화를 끊었다는 미담 아닌 미담도 전해졌다. 이 같은 가짜 전문가라도 구하지 못했을 때 취하는 최악의 방법이 인터뷰 날조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언론이 전문가 인용 없이 기사 쓰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기사에 인용되기 시작한 것은 저널리즘 역사에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당초 저널리즘의 주 역할은 사건을 잘 관찰해 전달하는 데 있었으나, 이는 텔레비전의 등장과 함께 흔들렸다. 영상보다 현장을 잘 묘사할 수는 없으므로 언론은 사건의 관찰자가 아니라 분석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규정했고, 심층적 분석을 위해 기사에 전문가 집단을 등장시키기 시작했다. 정보 홍수 시대에 분석가로서 언론의 기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고, 언론은 전문가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자들은 언제까지 지금처럼 더듬더듬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가? 진짜 전문가를 찾아내지 못하는 기자들의 무능력만 탓해야 하나?
관련 논문과 보고서를 누가 쓰고 있나
그 대안으로 늘 생각하는 것은 언론과 학계의 연결이다. 취재 주제에 대한 전문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를 누가 쓰고 있나 파악하는 것이다.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구글 스칼라(scholar.google.com)’ 사이트에서 잠깐만 검색해봐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파악할 수 있다.
학계와의 연결을 통한 기사 전문성 강화 노력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미국 하버드 대학 케네디스쿨의 쇼렌스타인 센터(Shorenstein Center)가 운영하는 ‘언론인 리소스(journalistsresource.org)’ 사이트다. 이 사이트의 주 목적은 언론인의 취재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학술연구 결과를 정리해 소개함으로써 보도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 예를 들면 2022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중간선거 보도에 도움되는 연구 결과와 팁’이라는 제목으로 선거 쟁점 이슈와 관련한 최근 연구 결과나 선거 취재에 참고할 만한 전문가의 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안내했다. 물론 이는 인력과 자본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공적 기금을 통해 시도해볼 만하다. 언론인 리소스 사이트 역시 미국의 공익 재단인 카네기 재단과 나이트 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돌아온 대왕 카스텔라, 언론도 달라질 수 있을까? [미디어 리터러시]
돌아온 대왕 카스텔라, 언론도 달라질 수 있을까? [미디어 리터러시]
김달아 (<기자협회보> 기자)
지난 설 연휴에 낯선 도시로 여행을 떠났다가 반가운 장면을 마주했다. 대왕 카스텔라 가게와 그 앞에 길게 늘어선 손님들이었다. 타이완에서 건너왔다는 대왕 카스텔라는 국내에서 몇 달...
-
통계와 데이터, 모두에게 똑같이 보일거라는 착각 [미디어 리터러시]
통계와 데이터, 모두에게 똑같이 보일거라는 착각 [미디어 리터러시]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웹툰 〈송곳〉을 본 사람들이 명대사로 꼽는 것이 있다.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 우리 대부분은 어디엔가 위치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고, 목표한 곳에 이르면 그 ...
-
〈다음 소희〉가 한국 언론에 말하는 것 [미디어 리터러시]
〈다음 소희〉가 한국 언론에 말하는 것 [미디어 리터러시]
신혜림 (CBS 유튜브 채널 ‘씨리얼’ PD)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1월. 교육계의 시선이 수능 연기 여부에 있던 참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률이 급락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전국 각지의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운...
-
‘챗지피티에 물어봤다’ 그만하고 다른 것을 질문하라 [미디어 리터러시]
‘챗지피티에 물어봤다’ 그만하고 다른 것을 질문하라 [미디어 리터러시]
조선희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감시팀 활동가)
“고종의 아이패드 도난 사건에 대해 알려줘.” 인공지능(AI) 회사 ‘오픈AI’가 내놓은 대화형 AI ‘챗지피티(ChatGPT)’에 물어보면 대답이 술술 나온다. “2013년 4월...
-
‘노조 회계 공개’ 논란에서 언론이 말해야 하는 것 [미디어 리터러시]
‘노조 회계 공개’ 논란에서 언론이 말해야 하는 것 [미디어 리터러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 남자가 가로등 밑에서 무언가 다급하게 찾고 있다. “잃어버리신 게 있나 봐요?” “예, 열쇠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 밑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아스팔트다. “여기에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