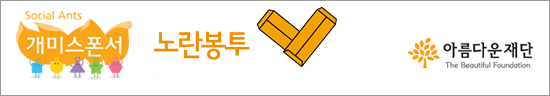“정말 ‘억’ 소리 나네요.”
회견문을 받아든 기자 입에서 나온 짧은 탄식이었다. 12월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겨울비를 맞으며 기자회견을 했다. 비닐 우비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손에 든 피켓은 점점 무거워졌다. 철도 파업이 시작되는 날이라 기자들은 철도 파업 현장으로 몰렸고 기자는 두 명이 전부였다. 그보다 열흘 전인 11월29일 경찰과 쌍용차 회사가 해고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우리더러 47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고 5년 동안 날품팔이 일용직으로 떠돌고 대리운전으로 밤길을 달렸던 지난 시간이 아스라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소식을 들은 아내는 “너무 가혹하다”라며 울먹였고,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께는 차마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싸웠다. 당시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투자는 물론 단 한 대의 신차도 생산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를 했다. 경영 파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선물로 죽음만을 남긴 채 그들은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공권력이 등장해 물불 가리지 않고 파업 노동자를 진압했다. 노동자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살의’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유통됐다. 이명박 정권 2년째에 일어난 일이다. 저항하는 이들의 본보기와 표적이 되어 쌍용차 노동자들이 당하고 맞았다. 맞은 것도 우리고 쫓겨난 것도 노동자들이다. 구속된 것도 우리며 심지어 목숨을 끊은 것마저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몫이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억울할 판에 되레 대한민국 경찰과 회사는 47억원을 노동자들이 물어내라고 한다.

해고 노동자들이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음을 경찰과 회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한 것은 표적 손배이며 본보기 손배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경찰 헬리콥터 파손과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을, 회사는 생산 차질에 대해 책임을 묻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다. 당장 경찰 헬리콥터의 어디가 어떻게 부서졌단 말인가. 백보 양보해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노동자 책임인가. 경찰 헬리콥터의 저공비행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건 오히려 우리다. 지금도 그날의 공포가 ‘헬리콥터 트라우마’로 온몸에 새겨진 사람들이다. 회사는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정치적·법적·사회적으로 이해가 갈린 채 조정 중이다.
손해배상 금액 47억원, 이자만 1년에 9억4000만원
눈을 씻고 외국 사례를 찾아봐도 노동자의 파업에 국가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경우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외국 사례를 샅샅이 찾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당장 통장·자동차·전셋집과 월급 등을 떼이고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47억원 원금뿐 아니라 이자 또한 살인적이다. 법정 연이자 20%를 적용하면 1시간에 10만7000원꼴, 하루에 257만원, 1년이면 이자만 9억4000만원이다. 손해배상 금액이 촘촘하게 삶을 옭아매고 촌각으로 해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쥐고 흔든다. 손배 문제는 개정 노동법에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다급한데 정치권은 한가해도 너무 한가하다. 손해배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과 쌍용차는 어떻게 응답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