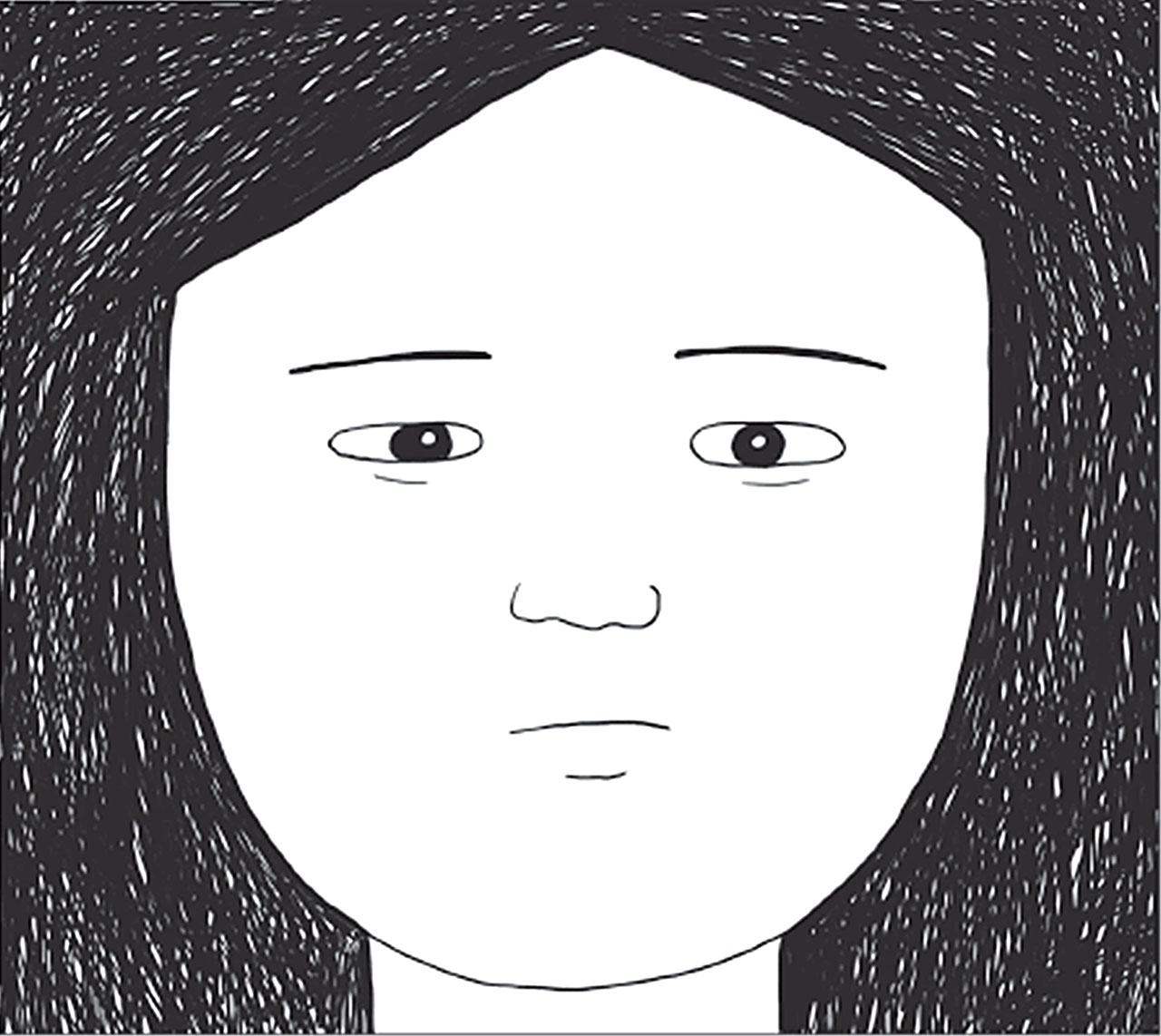
시작은 다소 충격적이다. 주인공 혜진은 아버지가 고독사했다는 연락을 받는다. 그것도 방치된 지 3~4주가 되었다는 통보였다. 흔히 상상하는 가족관계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혜진은 그 어떤 슬픔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다.
어쩌다 아버지는 가족과 인연을 끊게 된 걸까. 아버지는 왜 두 딸이 있는데도 혼자 살다 외롭게 죽어간 걸까. 저자는 혜진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며 독자를 그녀의 가족사로 이끈다.
아이 하나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30대 혜진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와도 같은 것이었다. 다만 그 죽음이 급작스러운 고독사라는 점에서, 가출과 외도, 가산 탕진 등으로 점철된 아버지를 향한 증오가 깊었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 선 혜진은 애도와는 다른 층위의 감정을 겪는다. 젓갈 냄새가 날 정도로 오래된 아버지 흔적(유품)은 혜진에게 풀지 못한 숙제처럼 남겨진다. 죽음을 애도할 수조차 없던 혜진은 결국 우울증을 앓는다.
저자의 자전적 경험이 상당 부분 녹아 있을 거라고 짐작되는 내용은, 내 개인적 경험과도 겹치는 지점이 많아서 놀라웠다. 다른 점이라면 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겪었고, 혜진은 성년이 되어 마주했다는 차이랄까. 장례식장을 찾은 지인들의 질문에 혜진은 난처함에서 벗어나려고 거짓 대답을 둘러댄다. 차마 아버지가 고독사했으며 죽은 지 몇 주나 지나 발견되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초등학교 졸업식 하루 전날 돌아가신, 집 떠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학교 선생님도 친척들도 “아니 어쩌다가” “이런 불쌍한 것” 등 상투적인 위로를 건넸다. 그때는 슬픔보다 수치심이 더 컸다. 내게는 그런 위로의 말이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고독사와 우울증에 대처하는 법
정신과 상담가는 혜진에게 아버지와의 좋은 기억 두 가지를 떠올려보라고 한다.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괴로운 기억을 말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혜진의 고백에 나도 가슴이 아팠다. 나 역시 아버지의 기억이 결여된 채로 살아왔기에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일은 미로에서 길 찾기처럼 힘겨웠다. 사랑도 행복도 학습되는 것이기에 행복해지려면 기를 쓰고 잃어버린 그 미로의 끝을 반드시 찾아야 했다. 좋은 기억을 자꾸 떠올리고 기꺼이 행복의 문으로 가는 열쇠를 찾아야만 한다.
저자는 혜진의 모습을 통해 현대사회의 두 가지 문제를 다룬다. 하나는 가족 해체로 인한 구성원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의 풍경(고독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늘고 있는 우울증 문제다. 정신적인 문제는 그것이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해도 한 개인에게 치명타를 입혀 다양한 증상으로 드러난다. 책에서 정신과 상담가가 말하듯, 진정한 애도나 화해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증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주변에서 그것이 신체적 장애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여럿 보았다. 방치해두면 정신이 육체를 침식시켜 대인관계가 불가능해지는 신체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저마다 고통의 깊이는 다를지라도 우리에게는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있다. 현대인의 대표적 질병 가운데 하나인 우울증에는 다행히도 그 해답이 있다. 부디 혜진처럼 마음의 병과 싸우는 많은 이가, 자신들의 문제를 꼭꼭 가두어 병을 키우지 말고, 억눌린 관계와의 진정한 화해 또는 애도, 힐링의 과정을 거쳐 어두운 터널 끝에서 따사로운 빛을 찾기 바란다.
-
뒤처진 저 꼬마 낙오자? 자유인?
뒤처진 저 꼬마 낙오자? 자유인?
이루리 (작가∙북극곰 편집장)
달은 아름답습니다. 바라만 봐도 참 좋습니다. 어려운 하루를 보낸 날도 둥근 달을 보면 힘이 납니다. 달에 사는 누군가를 상상하며 꿈을 키우고, 달을 달님이라 부르며 기도하기도 했...
-
새로 나온 책 [새로 나온 책]
새로 나온 책 [새로 나온 책]
시사IN 편집국
성폭력 문화에 깃든 감정 노동과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엠마 지음, 강미란 옮김, 우리나비 펴냄“여자들은 지속적이고 보이지 않는 감정의 부하 상태에 있다.”1875년생 밀레...
-
왜 산에 오르는 걸까?
왜 산에 오르는 걸까?
나경희 기자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빌렸던 책이다. 캠퍼스에서는 날마다 환영회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왜 제목에 ‘고독’이, 그것도 두 번이나 들어간 책을 골랐는지 모르겠다. 취미 동아리가 취업 ...
-
거침없는 질문 기발한 대답
거침없는 질문 기발한 대답
김서정 (동화작가∙평론가)
바람은 왜 이렇게 세차게 불까? 천둥은 왜 칠까? 시간은 어떤 때 빨리 가고 어떤 때 한없이 느리게 갈까? 밤은 어떻게 오는 걸까? 나는 왜 잠들지 못할까?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