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도쿄의 한 찻집에서 일본 기자를 만났다. 주요 일간지 소속인 그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한국 특파원으로 일한 만큼 한국어가 유창했다. 당시 나는 ‘아시아의 독립 언론과 탐사보도’라는 주제로 기획기사를 쓰기 위해 일본 언론인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에게 한·일 양국 언론 환경 차이에 대해 물었다.
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본 언론사 대부분은 정치부 기자들에게 각각 담당해야 할 정치인을 배정한다. 일종의 ‘마크맨’ 체계다. 여기까지는 우리 언론사와 비슷하다. 차이는 ‘기간’이다. 한번 특정 정치인의 마크맨이 되면 십수 년간 그 정치인에 관한 기사를 도맡는다. 짧게는 몇 달, 길어봐야 몇 년에 불과한 한국 마크맨 기자들과는 언론인 커리어 자체가 다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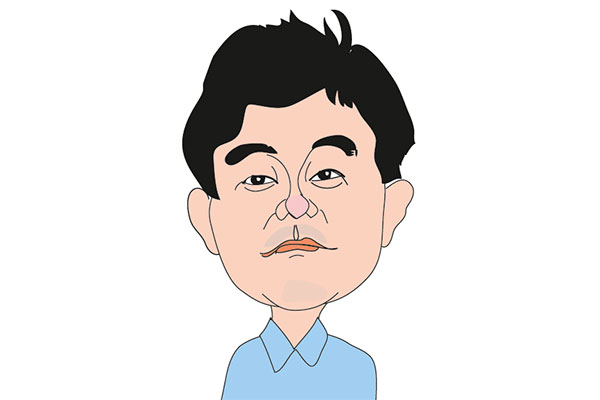
일본 특유의 정치 환경 때문이다. 한국의 ‘유력 정치인’은 ‘유력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반면 일본은 자민당 내 파벌정치가 권력을 분배하고 ‘여당 내 야당’을 만든다. 파벌을 이끄는 유력 정치인은 길게 권력을 누리고 그만큼 취재원으로서도 장수한다.
문제는 밀착이다. 특정 정치인이 권력을 쥐면 마크맨 기자도 해당 언론사에서 목소리가 높아진다. 원래 마크맨은 한 정치인을 밀착 마크해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지만 동시에 공생하는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다. 함께 오래갈 사이라면 과연 냉정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 많은 연구자와 비평가들은 이 구조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언론이 더 건강하다는 건 아니다. 일본 언론에 비해 팩트에 더 충실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일본 기자는 “한국 기자들은 기사를 너무 많이 쓴다. 과연 물리적으로 충분히 취재한 걸까 싶다”라고 말했다. 작은 기사에도 2~3명씩 달려들어 팩트를 확인하는 일본 언론 처지에서 한국 언론이 더 미숙해 보일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을 상대로 폭주하는 일본 정치인들을 보며 뒷맛이 개운치 않은 건 정치와 밀착도가 높은 일본 언론의 현실이 떠올라서다.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언론의 자유도는 서로 비례한다.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는 일본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
내게는 19년을 취재한 사건이 있다 [프리스타일]
내게는 19년을 취재한 사건이 있다 [프리스타일]
정희상 기자
고 김훈 중위가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기까지 강산이 두 번 바뀌었다. 지난 19년 동안 나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김훈 중위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자...
-
대림동 프로젝트에 상찬 쇄도 [취재 뒷담화]
대림동 프로젝트에 상찬 쇄도 [취재 뒷담화]
고제규 편집국장
“대림동 기사 볼만했어요. 한 쪽씩 할애한 인물 사진도 좋았고(안병찬 원 〈시사저널〉 발행인)”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르포를 읽었다(@the_hours_)”. 언론계 선배부터 트...
-
어느 조선족 엄마가 보낸 이메일 [프리스타일]
어느 조선족 엄마가 보낸 이메일 [프리스타일]
김동인 기자
댓글에 무덤덤한 편이다.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웬만하면 다 읽는다. 유쾌한 댓글만 있는 건 아니다. 독자의 반응은 새겨들어야 하지만, 종종 내용 없는 인신공격성 댓글로 가득할 때도...
-
“너만 사진 찍냐” 특종을 부른 한마디 [취재 뒷담화]
“너만 사진 찍냐” 특종을 부른 한마디 [취재 뒷담화]
고제규 편집국장
순간포착 비결은? 자리싸움과 기다림.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착 하루 전인 2월25일부터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서 뻗치기 시작. 전 세계 기자들과 경쟁했을 텐데? 1라운드는 사다리 높...
-
‘진짜 기자’ 우에무라를 위하여
‘진짜 기자’ 우에무라를 위하여
문성희 (<슈칸 긴요비> 기자)
지난 9월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하노이의 아침’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원로들이 모였다. 일본의 한 저널리스트를 후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임재경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