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No Kids Zone)’을 다룬 기사에는 많은 댓글이 달린다. 주로 그런 결정을 내린 점주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개념 없는 부모’의 목격 사례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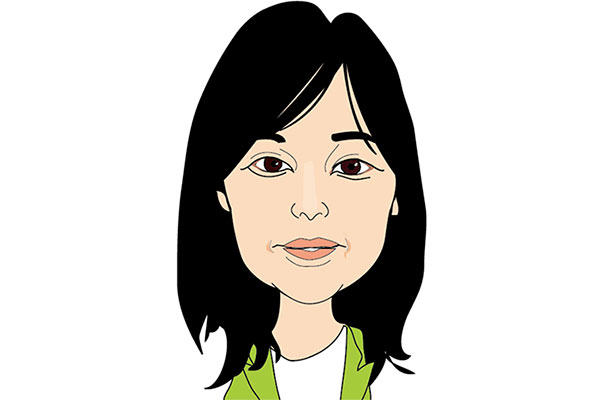
나 역시 실생활에서 노키즈존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체감한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는 않지만, 아이 없는 곳을 찾게 된다는 지인도 있다. 이해는 된다.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몇 년 새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두 달 전만 해도 아이와 함께 다녀왔던 곳이 그새 노키즈존으로 바뀌어 있기도 했다. 아직 글을 몰라서 왜 안 들어가느냐고 묻는 아이에게 설명할 말을 찾다가 오늘은 문을 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한적한 시골 곳곳에도 노키즈존이 있는 건 인상적이었다. 느리게 시간을 쓰러 온 여행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곳이라 더 그런 것 같았다. 느닷없이 마주하는 풍경에 익숙해졌다.
문구는 예의바르다. 죄송하지만 안 되겠다는 간곡함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우호적인 곳을 찾기보다는 외식을 자제하는 쪽으로 적응했다. 돈 내고 눈치 보는 심정이 편할 리 없다. 어떤 부모는 아이와 외식을 가면 바닥에 커다란 봉지를 깐 다음 흘린 걸 한꺼번에 주워온다고 했다. ‘맘충’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쓰는 이들에게 “너는 맘충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 건 전혀 고마운 일이 아니다.
새삼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최근 경험한 일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올해로 96세인 할머니가 서울 사는 딸네 집에 다니러 왔다가 동네 미용실을 찾았는데 너무 연장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했다. 주된 손님이 20~30대로 보이긴 했지만 거절의 이유가 참으로 명쾌해 좀 놀랐다. 거절 자체도 그렇지만 아이와는 달리 거절의 언어는 물론 상대의 표정과 작은 몸짓까지 명확히 이해하는 성인을 향한 의사표시라 더 걸렸다.
이것은 다만 개인의 일탈일까? 시작은 늘 이런 식이 아닐까. 반복되고 하나둘씩 지지받다가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 풍경. 최근 한 지역에서 중·고등학생 출입을 금지하는 커피숍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그에 대한 댓글도 호응 일색이었다. 댓글이 곧 여론이라고는 믿기 힘든 시절이지만 또다시 익숙해져야 할 어떤 풍경에 대해 다시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
된장녀가 나이 먹으면 ‘맘충’이 된다고?
된장녀가 나이 먹으면 ‘맘충’이 된다고?
임지영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카페는 지난 3월부터 유아와 동반하는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30개월 넘은 남자아이를 키우는 가게 운영자는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누구보다 육아...
-
어느 가족 꼬리에 매달린 폭탄
어느 가족 꼬리에 매달린 폭탄
김서정 (동화작가∙평론가)
때 아닌 노키즈존(No Kids Zone) 논란이 일고 있다.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 때문에 곤란해하던 카페나 음식점에서 아이들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환영파도 있고 비...
